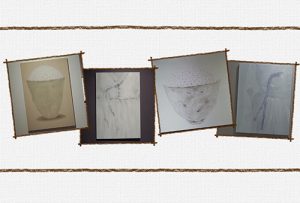//작가노트//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밥 한 그릇을 생각하며 막내의 입에 들어갈 생각에 본인의 손끝을 저미는 시린 감촉은 잊어버리고 몇 번이고 쌀뜨물 속을 헤맨다.
시작은 어머니다. 젖으로 시작하여 허기진 배를 채워 주고자 내어주신 어머니의 따뜻한 밥 한 그릇에 담긴 넘쳐나는 마음에 위로만 있을 뿐이다. 막내는 관심과 간섭을 구분 하지 못한 채 하염없이 받기만 한 마음에 고마움은커녕 주는 밥도 못 먹는다. 어리석게도 배가 고픈 이유를 찾지 못한다.
밥 한 그릇은 기(器)에 담긴 마음이다. 그 형상은 고봉밥이 되어 태산만한 가르침으로 다가오기도, 자작한 보리차에 말아져 쉬이 삼킬 수 있을 정도의 위로로 다가오기도 하여 마음을 받은 이를 위해 매번 다른 풀이와 해석으로 그 형상이 변화한다.
펼쳐지고 흩어졌다 모여 밥이 되는 순간이다.
쌀은 밥이 되고, 밥은 살이 되고, 살은 다시 쌀이 된다. 이것과 저것이 같음은 교감에서 오는 것이다. 마음의 깊이는 어지럽게 널려 가로막은 벽을 가진 미로처럼 복작거리어 번거롭고, 알 수는 없지만, 본능적인 연민(憐憫)이다. 그 마음에 온기 가득하길 바래본다. 오는 마음에 가는 고마움은 순조롭고 고요한 이치다. 오롯이 어머니가 쌓아올린 밥 한 그릇은 화(和)이다.
//작가노트//
매무새
여기에는 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저 아주 작은 움직임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옷감 사이를 한올 한올 지나가는 작은 숨결이었습니다..
그 숨결은 나의 들숨으로 내 마음을 살며시 흔들어주었습니다..
저녁밥을 차려주는 엄마의 냄새처럼, 포근히 안아주는 할머니 냄새처럼,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숨결을 따라 붓을 들었습니다.
무엇을 담고자 애쓰지 않고 그저 그것이 들려주는 작은 숨결을 따라갔습니다.
하얀 캔버스를 쓰다듬고 매만지는 나를 바라보게 되었고, 파렛트에 짜여진 물감은 나를 고요하게 했습니다.
하얀 캔버스에 스케치를 여린 선으로 수없이 반복하는 순간 나의 몸은 붓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나의 움직임은 붓질이 되고 나의 숨을 따라 행과 열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숨결 하나가 커다란 캔버스를 되살리는 듯 그려가고 있었습니다.
대상과 내가 하나 되는 듯, 들숨과 날숨의 한 호흡으로,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그런 묘한 순간이었습니다.
한 그림쟁이에게 그 작은 숨결하나가 그림의 매무새를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갑니다…
– 장소 : 갤러리 우
– 일시 : 2017. 8. 23. – 9. 10.
추PD의 아틀리에 / www.artv.kr / abc@busan.com